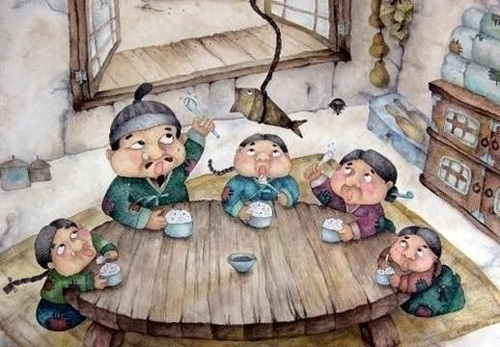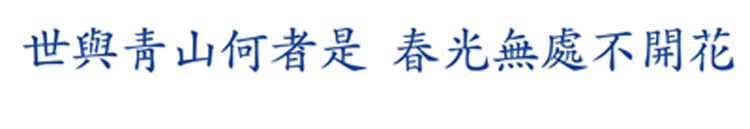일조진(一朝塵) / 맹난자 은퇴 이후의 삶이란 언뜻 평온해 보이나 기실은 좀 지루하다. 바쁘지 않게 해가 뜨고 별다른 일 없이 해가 진다. 그날이 그날 같다지만 몸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렇지 않다. 하루에도 수만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며, 하루 동안에도 마음은 대략 5만 가지를 생각할 정도로 산란하게 요동치며 변화를 계속한다. 항상(恒常) 한 것은 하나도 없다. 어제와 달라진 나를 감지하며 천천히 물러나는 일을 익히는 중이다. 액자 '虛心'에 눈이 더 간다. 글씨를 써주신 오영수 선생도 벌써 딴 세상 사람이 되셨다. 요즘 나는 를 통해 지인들과 함께한 추억의 시간 속으로 곧잘 빠져들곤 한다. '지나친 그 세월이 나를 울립니다.' 이 멜로디를 기타로 들려주시던 선생의 모습도 그립고, "파도여 파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