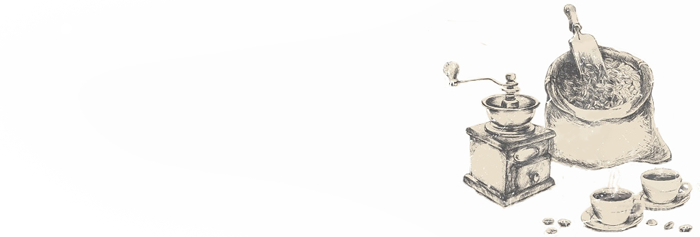채송화 이야기 / 김진수 참 이상한 일이다. 글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다. 계절이 자꾸 지나건만 도대체 글이 잡히지 않는다. 그러던 가을 어느 날 밤이었다. 서재에 불을 끄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는데 책상 위에 걸린 액자 하나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. 문단 데뷔 기념으로 선물 받은 채송화 액자였다. 누가 밀어올린 걸까. 돌각사리 틈 사이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액자 속의 채송화. 불을 켜자 수줍고 해맑은 어린 소녀같이 까르르까르르 색동웃음을 마구 토해내는 것 같다. 밤하늘 은하의 별무리 같기도 하고, 어느 여왕이 보석상자를 엎질러 놓은 것 같기도 하였다. 나는 곧바로 컴퓨터 창을 열었다. 옛날 페르시아에 보석을 좋아하는 여왕이 살았다. 얼마나 보석을 좋아했는지 자신의 백성들과 보석을 한 개씩..